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기온은 낮은 날이 34도에서 높게는 41도에 이르렀다. 닷새 만에 739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는데(사망자 수는 추정한 것이어서 조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어떤 재해와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 숫자도 숫자지만, 피해가 일부 집단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부분 사망자는 도심에 사는 빈곤층 노인이었는데, 냉방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전기료 때문에 더위를 그냥 견뎠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둑이나 강도를 걱정해서 작은 창문조차 닫아 놓은 사람들이 많았다.
2003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염과 사망도 유명하다. 8월 4일부터 18일 사이에 프랑스 전국의 기후관측소 중 3분의 2가 35도 이상의 최고온도를 기록했고 15%에서는 40도 이상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1만 5천명 가까운 사람이 더위 때문에 더 사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에 있는 좁은 방(원룸이나 프랑스식 옥탑방이 많았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시카고와 비슷하다.
엄청나게 덥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싶지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종합한 정설이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리 없다. 1994년에서 200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2006년 서울대 김호 교수 연구팀), 서울의 경우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사망률이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다른 대도시에서도 경향이 비슷하다.
방식이야 어떻든 더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확실하다. 시카고나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더위는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건강위험인 셈이다(더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폭염 때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은 의학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열사병이 늘어나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표적인 희생자인 노인들은 땀으로 체온을 낮추는 기능도 약해져 있다.
그러나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로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가령 심장이 약하고 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과 사망은 얼마든지 피하고 예방할 수 있다. 시카고 사례에서 보듯이, 죽음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에 집중되었다. 이들에게는 ‘취약계층’이 흔히 그렇듯 고령,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시설이라는 서너 가지의 악조건이 겹친다. 사회적 원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폭염 때문에 초래되는 사망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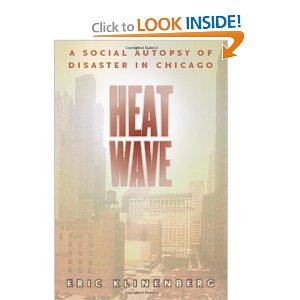
<1995년 시카고의 폭염과 사망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명저
Heat Wave, 시카고 대학 출판부 2003>
시카고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 같은 더위에도 죽음을 불러오는 사회적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화와 빈곤이라는 요인이 두드러진다.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인 가구에 속한 빈곤인구의 72%는 60대 이상이고, 2인 가구에 속한 빈곤인구의 68.2%도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이제 노인과 빈곤, 그리고 단독가구는 따로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이 문제가 된다. 빈곤층과 빈곤 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박신영의 연구(《보건복지포럼》2012년 2월호)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약 184만 가구(전체 가구의 10.6%)에 이른다. 아마도 빈곤 노인 대다수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빈곤층 노인을 둘러싼 환경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2010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펴낸 『폭염이 서울시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조사』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 20명의 연령은 평균 73.4세, 쪽방의 평균 크기는 5.1제곱미터(약 1.5평)였다. 절반은 선풍기가 없었고, 1/3은 창문조차 없었다. 결과적으로 쪽방 사람들은 여름철 권고치보다 대략 5도 정도 높은 실내 기온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상태가 나쁜 것도 당연한 일, 대부분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더위에 얼마나 취약할까.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령,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시설이라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 더위는 심각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바뀐다. 그렇지만, 사회적 요인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건강 악화는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다 개인의 취약성이 합해져서 빚어낸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은 최대한 은폐되기 때문이다. 더위와 건강을 연결시키는 것이 생소할 뿐 아니라, “환기만 제대로 해도 그 정도까지는….”이라는 식의 “희생자 비난하기”에 쉽게 묻힌다.
사회적 죽음을 예방하는 방법은 중층적이고 통합적이다. 우선, ‘폭염행동요령’과 같은 개인적 행동지침이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이 비록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적 죽음을 개인의 행동교정으로 막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나마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은 지역을 기초로 한 집단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식수 공급, 목욕 시설의 설치, 무더위 쉼터 같은 방법들은 삶의 공동체를 만들고 고쳐 나가는 일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문보건이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도 지역복지의 전체 틀 속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예방조치들은 노인의 소득보장, 빈곤 감소, 주거복지, 건강증진과 일상기능 향상이라는 복지국가의 지향에 맞닿는다.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칫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 죽음인 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폭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의 상당수가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는 문제의식(또는 관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젠더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말을 건강에 빌려 오자면, “사회적 결정요인 주류화”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여름,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쪽에서는 사회적 결정요인이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 참고한 자료
– Eric Klinenberg.?”Dead Heat: Why don’t Americans sweat over heat-wave deaths?”.?Slate.com. 2002.
– Marc Poumadere 외. The 2003 Heat Wave in France: Dangerous Climate Change Here and Now. Risk Analysis, Vol. 25, No. 6,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