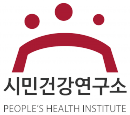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기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쇠락한 지방 소도시를 가게 되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한때는 거리가 북적였고,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이 넘쳐났으며, 경기가 좋을 때는 “개도 만[…]
서리풀연구통
독수리가 사라지자 사람이 죽었다
최강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필자는 유튜브를 떠돌다 미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 영상을 보았다. 요트를 타고 일부러 큰 물살을 일으키며 낙동강 하구에서 휴식하던 큰고니 무리를 쫓아내는 모습이었다. 죄 없는 동물을[…]
추천 글
자기돌봄은 정말 ‘자기’만을 위한 것일까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돌봄이나 자기관리는 대체로 성실함과 규율의 언어로 이해된다. “갓생” 이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듯, 자기돌봄은 하루의 루틴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식단을 계획하며, 질병과 위험을 사전에[…]
추천 글
존재하지만 동시에 부재하는 돌봄 – 여성노인은 왜 혼자 남겨지는가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소설 『딸에 대하여』(김혜진, 민음사)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년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그녀가 일하는 요양원에는 독거노인 ‘젠’이 있다. ‘젠’을 돌보는 일, 정해진 시간 동안 식사를 챙기고, 약을 확인하고,[…]
추천 글
치매 환자의 시선으로부터
박주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그리고 치매 돌봄 지난 1월 14일, 또 한 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치매 걸린 80대 어머니를 돌보던 60대 아들이 체포됐다. 아들은 일용직으로[…]
추천 글
“집에서 눈감고 싶다”는 소망, 왜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까?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장기요양 돌봄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가정[…]
추천 글
헤게모니 질서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건강 거버넌스를 생각해야할 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년 새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괴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 최강국’ 지위를 활용해 이주민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추천 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왜 고립감을 느끼는가?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긴급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종식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추천 글
지역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마냥 좋은가?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추천 글
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