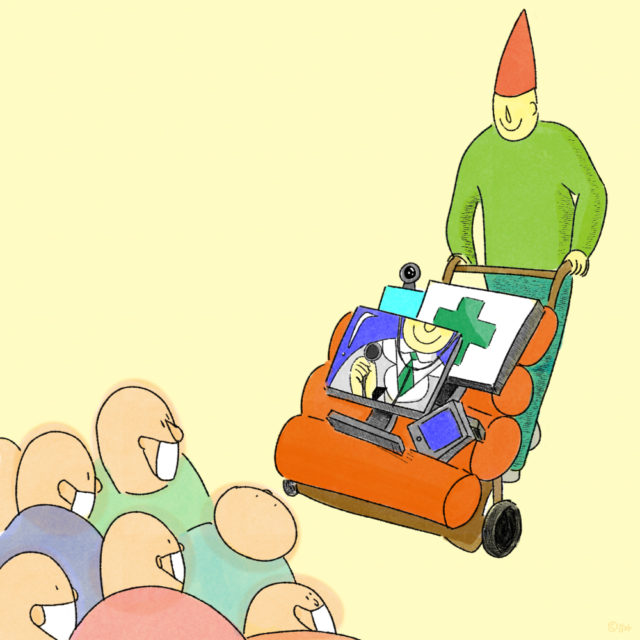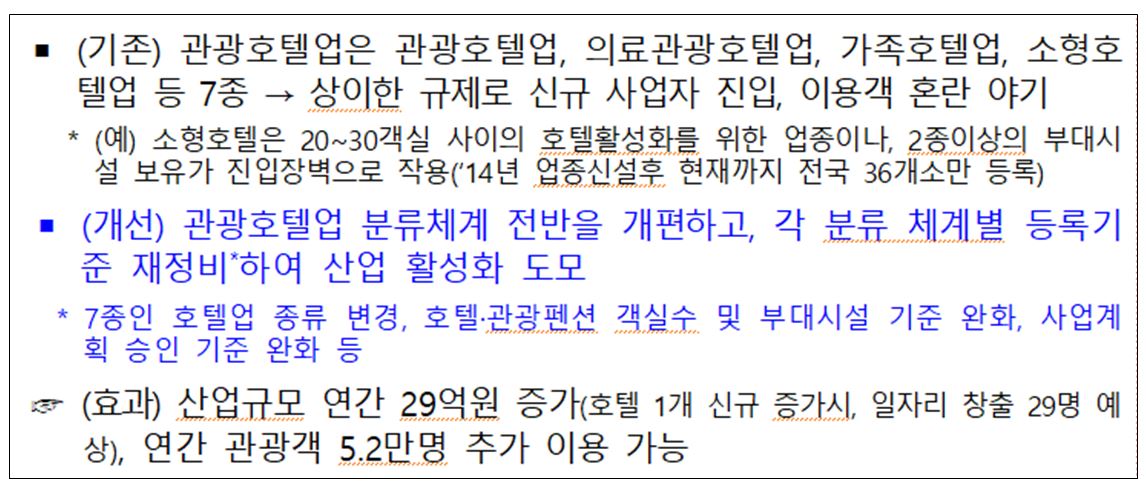‘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좋은 뜻도 있겠지” 등등. 이렇게 갈까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 유행이 ‘뉴노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부의 경제 담론은 ‘올드노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10~20년 주창해 온 이른바 ‘성장동력론’을 지치지도 않고 또 꺼내 들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름과 얼굴 분칠만 바꾸면 뭐하나, 거의 20년째 고장 난 녹음기가 따로 없다.
이 정도면 ‘재난 자본주의’(나오미 클라인)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과대평가가 아닌가 싶다. 정치적 또는 지적(知的) ‘게으름’, 그게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도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무능력’. 우리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사회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기득권(보수)이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데 세 가지 논리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기사 바로가기).
(1)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역효과 논리
(2)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는 무용 명제
(3)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것”이라는 위험 명제
한국 사정에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할 것 같다. “해 보지도 않고”라는 가능성 명제. 거기에다 하나 더. 이 모든 명제의 바탕에는 경제주의, 성장주의, ‘먹고사니즘’이라는 오랜 국정 이념과 신앙에 가까운 사회적 지향이 존재한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탁상공론의 옳고 그름이면 잠깐 눈감으면 그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국민(더 넓히면 다른 나라 사람까지 포함한 ‘인민’)의 편익과 행복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우리도 지치지 않을 참이다.
구조가 바뀌지 않았으니 원격의료 옹호론자들의 허구와 위선을 지적하는 논리도 새로운 것이 적다. 이 또한 조심할 일이다. 지겨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 깊게 이해하고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라도 막아서야 잘못되지 않는다.
-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다
부담스러웠으니 말을 바꿨을 터. 무슨 학술적 토론을 하거니 이론을 동원할 깜냥도 아니다. 그냥 그게 그것, 같은 말이다. 이게 기술이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점은 가외의 성과다.
- 국민의 건강, 보건, 의료에 도움이 되나?
정말 이것이 목표라면 급하고 효과적인 것이 더 많다. 거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곳에 사는 환자, 노인, 장애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왕진, 방문보건, 주치의제도, 기초 공공의료 확충 등이 웬만하면, 보완적 수단(더 쉽고, 싸고, 편리한)인 원격의료를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다. 주객을 바꾸지 말라.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면 쓰임새가 있다고? 병원과 의원,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시스템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비대면 진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환자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6만 명을 전화로 진료한 결과 무슨 무슨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환자인지 제발 좀 생각해 보시라.
- 경제적 효과? 어떻게 가능한지 모델을 제시하라.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 지상주의자거나 영리 의료를 무작정 악마로 생각하는 무슨 ‘꼴통’이 아니다. 모두 코로나 유행의 무시무시한 결과, 대규모 실업과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 도산, 자영업 붕괴, 무엇보다 빈곤 쓰나미를 걱정한다. 마땅히 정확하고 합당한 경제적 조치가 적시에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가 아예 문서에도 박아둔 이름,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과 원격의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경제 방대본’이라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에 올라탄 이 기회주의적 또 보기가 국민이 원하는 경제, 노동, 그 어려운 뉴노멀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지금 ‘경제 방역’은 사실 방역, 지금 분출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앞서 인용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대책 한 가지를 보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원자료를 복사해 옮긴다).
문을 닫느니 마느니 얼마나 많은 직원을 해고하느니 하는 마당에, ‘규제혁신’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호텔을 더 짓게 한다는 것, 도무지 이런 탁상공론을 본 적이 있는가?
논리는커녕 분위기도 맞추지 못한 동문서답, 혹시 경제 관료들의 태업 사태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보건의료 분야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앞서 인용한 보도자료를 참고할 것). 무슨 논리인지, 무슨 방법인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냥 내내 하던 말이다. 따로 항목이 없는 원격의료도 필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책이 아니라 선언, 그것도 선동에 가까운 참 익숙한 이데올로기.
건강으로도 경제로도 의미가 없는 원격의료 활성화. 반대한다는 말조차 거창하다. 솔직히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지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는 이것이 정책을 넘어 우리 체제와 관련이 있는 정치경제적 프로젝트라 생각한다(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