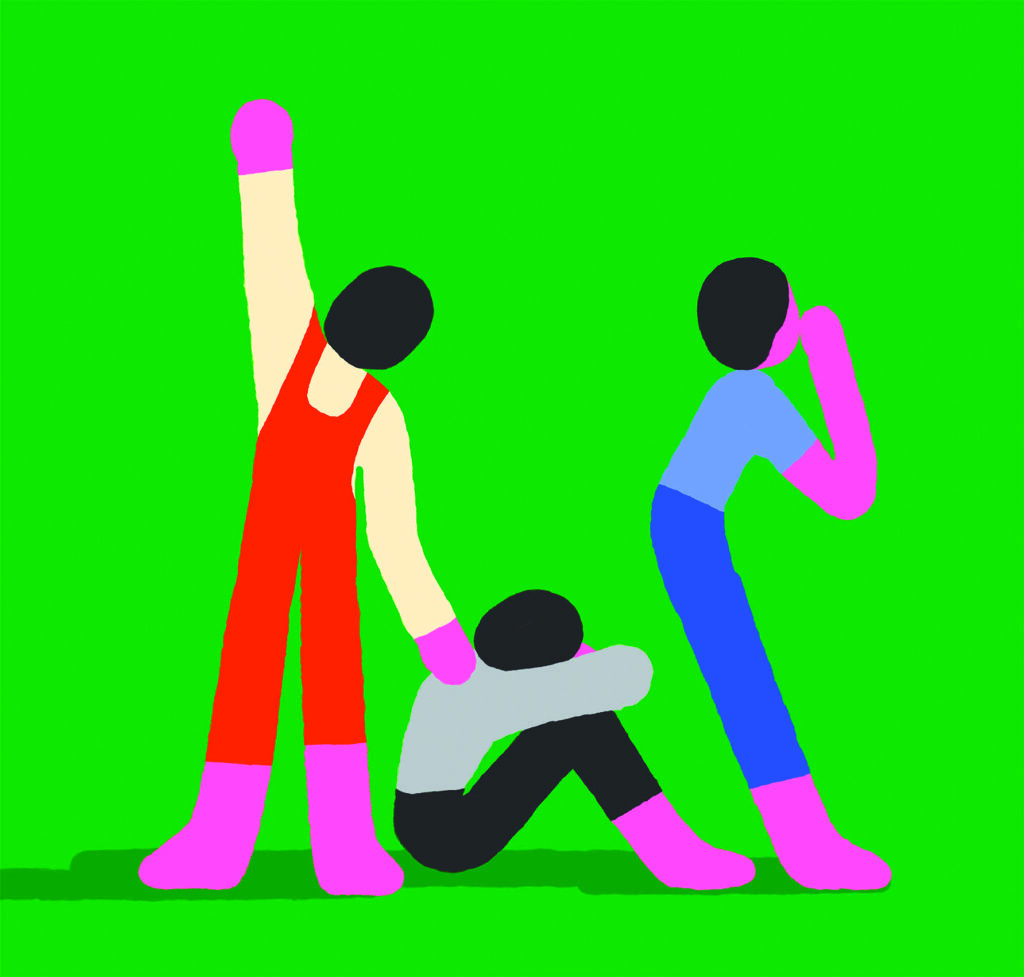글 :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이 1등이 되길 원했어.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야구방망이로 모두의 엉덩이를 때렸어. 그렇게 맞고 나면 한동안은 계단을 잘 오르내릴 수 없었어. 다 같이 맞고 꾸중 듣던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왜 우리가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그러자 선생님은 부모님께 서명을 받아 온 학생들은 더는 때리지 않겠다고 했어. 비록 부모님 허락이 필요했지만, 말해 보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부모님 서명을 받아 온 학생은 나와 한 남학생 둘뿐이었어.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셨고, 학교 일에 세밀하게 신경 쓰기 어려웠고, 선생님을 크게 믿었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달라는 분도 계셨어. 결국, 나는 맞지 않게 되었지만, 전보다 더 불편해졌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야구방망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나.
오늘은 고통을 말하는 일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싶어.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란 생각은 했지만, 다른 불안은 없었거든. 하지만, 누군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겪고 있어도 말하기 곤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성폭행,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학대를 말하는 건 쉽지 않아. 이런 말하기는 보복의 두려움과 공포, 수치를 뚫고 일어나.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기존 힘의 관계에 저항하는 거야.
말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 왜일까?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서명을 요구했어. 학생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많은 경우 아이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여겨져 아예 배제되거나, 부모나 다른 전문가의 판단을 요구받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 말을 하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이해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걸까? 1990년 가을,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던 여학생들이 여자 화장실에 성폭행범의 이름을 알리는 낙서를 했어. 성폭행범의 이름과 함께 법과 경찰, 학교의 부당하고 부실한 대응을 낙서로 고발했어. 낙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피해자들은 서명보다 낙서가 안전하다고 느꼈어. 학교는 당황했고 낙서를 지웠지만, 낙서는 계속해서 등장했어. 결국, 학교는 성폭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 대응 부서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해야 했어.
‘말하기’에서 ‘말’은 음성을 의미해. 하지만,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다면? 말하는 게 위험하다면? 나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말하기는 넓어져야 해. ‘내가 겪은 가정에서의 성폭행을 말하는 157가지 방법’이라는 에밀리 레비의 시 일부분을 소개하고 싶어. 시의 마지막 줄처럼, 우리가 고통을 알리고 말하려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함일 거야.
그 일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해 줘/ 수화로 말해 줘/ 시로 말해 줘/ 연극으로 말해 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말해 줘/ 어린이의 힘을 존중해서 말해 줘/ 스포츠로 말해 줘/ 길거리 예술로 말해 줘/ 과학 실험으로 말해 줘/ 노래로 말해 줘/ 잠꼬대로 말해 줘/ 세계의 지도로 말해 줘/ 그걸 말하는 게 여전히 금지된 것처럼 말해 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