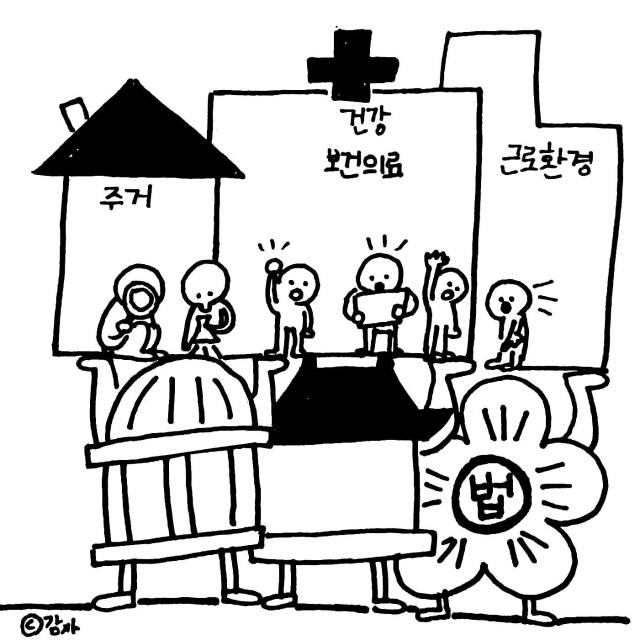‘서리풀 논평’을 응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린다. 혹시 비관하거나 절망할 환경이 더 많더라도, 새해에는 일부러 낙관하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닌 한, 조건이 곧 원인일 수는, 그리하여 기계적 인과관계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어떤 조건도 받아 안아 스스로 양분과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먼저 지난해 2016년의 의미. ‘촛불’을 빼고 2016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날, 광장에 나온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다니, 2016년 후반은 전체가 하나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으로 ‘구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면, 촛불은 한 세대를 지속한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보다는 모종의 낙관을 회복한 것이 큰 의의라 해야 하겠다. 시민의 열망에 대해, 또한 시민이 가진 힘에 대해, 냉소와 회의가 많이 줄었다. 다시 무엇인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에너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이 역사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거기까지, 그리고 그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에 2017년을 맞는다. 모두가 관심을 가진 탄핵 심판 자체는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다. 1월이든 3월이든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그 어느 잣대로도 다른 경우를 상상하지 못하니, 이건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그 이후. 물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 일정은 기계적으로 확실하다. 막상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불확실성은 이런 것들이다.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새 대통령은 정말 다를까? 그리하여 다음 시대와 사회는?
먼저 짚어야 할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다. 좋고 옳은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열 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그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기초연금을 올릴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손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범위(급여)와 진료비(수가)를 바꾸거나 본인부담을 낮추는 일도 결국 그의 몫이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할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것인지,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지, 이런 논란에서도 어떤 대통령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 가지 잊지 말 일은 이때 대통령은 개인이자 집단이며, 또한 정신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니, 2017년 첫째 할 일은 끈질기게 ‘정치적 관심’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은 나와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상과 생활의 과제와 직결된다. 나의 이해가 걸렸으니 당연히 끝까지 보고 살피며 말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형식적으로는 제도정치의 역할인 것이 분명하다.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를 뽑고 선거를 치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중구난방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바로 제도정치다.
제도정치와 시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제도정치와 정당은 시민(주권자, 유권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의제를 핑계로 끊임없이 시민의 직접 행동을 경계하고 배제하려 한다. 정치가 자기 기반을 소외시키려는 자기 배반이자 모순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당과 정치인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점점 더 자주 이 말을 듣게 되리라 예상한다.
거듭 강조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테니 본분과 본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경계해야 한다. 역할을 따지는 것은 곧 시민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아닌가. 제도정치가 안심하는 그런 참여, 구경꾼이나 훈수꾼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2017년 우리가 관심을 두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어떤 대통령 어떤 정권인지를 묻는 것이 다음 할 일이다. 2016년 모든 시민이 구체제를 청산하는 데에 동의했다면, 2017년은 어떤 대통령과 정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정부여야 하는지,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낡고 악한 것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2017년은 새롭고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만드는 때다. 다음 정부에서 정치, 남북관계, 경제, 언론, 검찰, 노동, 복지, 교육, 보건은 어때야 하는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청년 일자리와 노인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도정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에, 이번에도 공약은 기술과 정책을 두루 망라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제시하여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그 모든 약속은 허무하다!
시민이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말하며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시민이 권력의 주체라면 각자 미래를 꿈꾸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구상에서 나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잘 알든 모르든 큰 계획이 있는 없든, 나도 정치 공동체에 참가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음’이고 또한 ‘옳음’이다.
사회체제 차원에서도 이제 시민의 힘에 기대야 한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어때야 하는지, 그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대통령 선거 공약에 오죽 잘 정리되어 있으려고? 아니다. 어느 경제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던가? 어느 사회정책 전문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그렇게 전문적이던가?
이른바 전문가는 단순 기술자가 된 지 오래, 미래 비전과 사회적 지향이 정립된 이후에야 기술과 방법론을 말하는 데에 익숙하다. 그들은 시민과 주권자에 봉사해야 마땅하나, 그나 우리나 기술과 방법을 버릇처럼 비전과 지향으로 혼동한다.
다음 정부의 새로움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시민과 주권자가 정치적 ‘주인 됨’을 회복해야 다음 정부가 어떤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시민이 말하고, ‘그들’이 들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다.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말하는 것은 행동이고 실천이 아닌가. 혼자 동떨어져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모이고 뭉치고 집단이 되어야 한다. 조직과 집합적 행동이 힘과 임팩트를 키울 수 있다.
2017년은 새로운 모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던 조직은 더 커지기를 바란다. 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약한 결속(weak ties)’이 너른 기반을 가지면 때로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한 가지 예.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유명하지만(☞관련 기사 바로 가기), 그의 작은 행동이 큰 사회적 운동으로 전화한 데에는 지역사회 연결망, 그중에서도 약한 연결(결속)의 역할이 컸다(The Power of Habit: Why We Do What We Do in Life and Business, 8장, (☞바로 가기)).
어떤 것은 완전히 새롭게, 어떤 것은 옛것을 새롭게, 당분간 우리에게는 많은 연결과 결속의 기회가 있다. 다음 대통령이 어때야 하는지 어디서나 늘 말할 것 아닌가? 이것들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공공적으로 보호하는 통로와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관심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 삶과 생활에 기초하여 새로움을 말하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통로와 매개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 이 모두는 멀리 보고 이 시대에 녹아들어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은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그리고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2017년이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