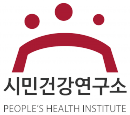[사례기고 ③]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
| 이재명정부의 국정계획이 발표되었다. 상병수당 확대, 제도화, 본 제도 시행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앞으로 제도의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얼마나 다루어질지도 알기 어렵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은 사례공모전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가 필요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는 노동자, 생활비 걱정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래도 병가가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노동자까지, 여러 경험을 확인했다. 이중 수상작 6편을 바탕으로 세 차례 글을 싣는다. |
(불)건강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건강(불)형평을 사회적 결정요인과 떼어놓고 살피기 어려운 이유다. 이제 우리는 논의를 더 확장시켜야 한다. (불)건강에 ‘대처하는 힘’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박씨, 백화점 노동자를 거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씨, 프리랜서 이씨의 사연에서 질병에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운 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파도 쉴 권리가 주어지지 못한 사회 탓이다(성씨는 모두 가명).
유급병가, 노동자의 권리
박씨의 첫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지금도 10년 전 그 때를 생각하면 두려우면서도 벅찬 감정이 교차한다. 임신 초기 첫 하혈을 경험했을 때부터 두려움은 시작되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안정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처음 든 생각은 ‘병가를 내면 불이익을 받을까? (아니면) 그만둬야하나’ 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 더 출근했다.
…………………
(오마이뉴스 2025년 9월 3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