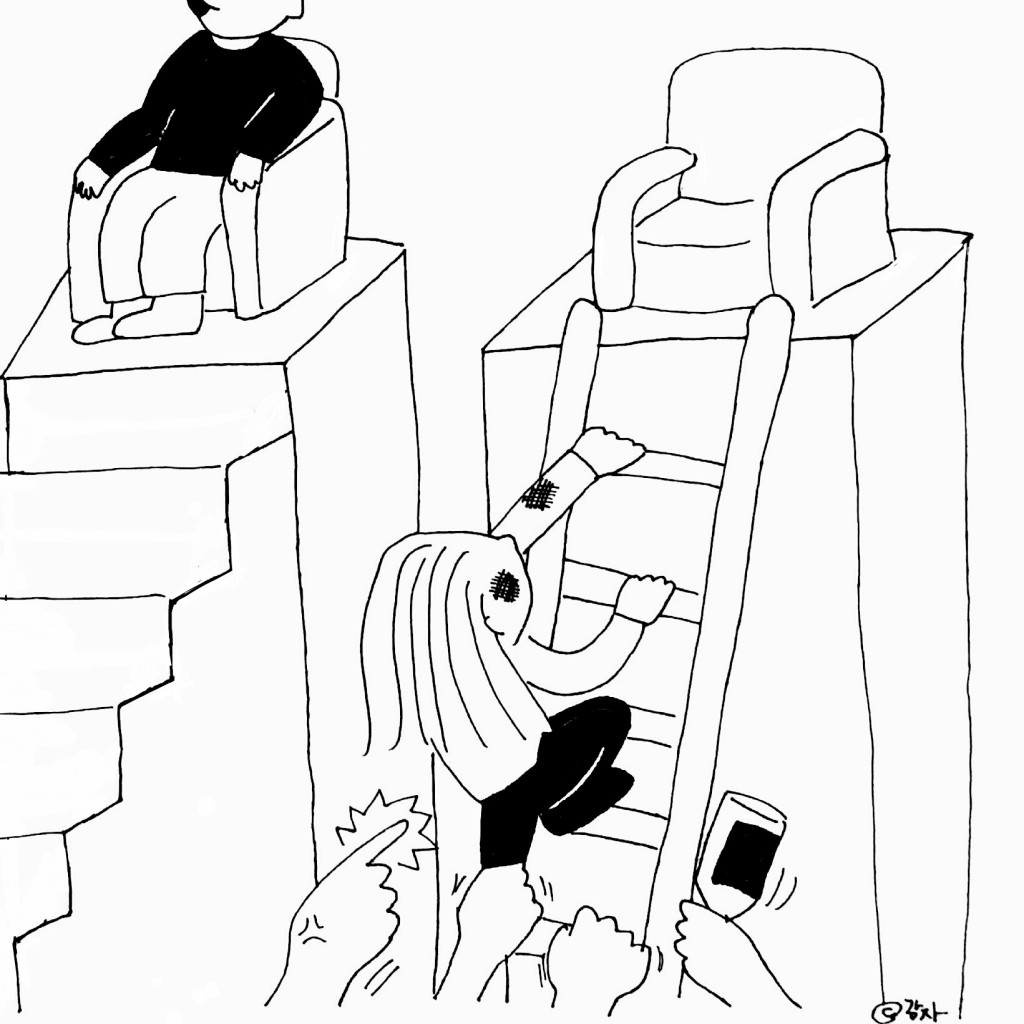2015년 6월의 언론 보도.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3만 636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2667명,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은 1108명, 상해는 2257명, 강간·강제 추행은 678명, 살인미수는 64명으로 총 6774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치사·상해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 평균 58명꼴이다.” (2015년 6월 24일 기사 바로가기)
바로 어제 기사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3월 6일 바로가기)
단속했더니(!), 하루 2명꼴로 구속자가 나왔다. 일부러 집중했으니 통계가 ‘과장’일 수 있지만, 보통의 조사 통계(주로 여성 폭력에 대한)가 ‘과소’일 가능성이 더 크다. 어느 쪽이든, 데이트 폭력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내친김에 우리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서리풀 연구통>, 막 지나간 것 한 가지도 같이 참고하자.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연인, 부부,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및 행동 통제 등을 지칭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만큼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폭력들에 비해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 (2015년 12월 4일자 연구통 바로가기)
경과야 어찌 되었든, 연인 또는 파트너 사이의 폭력은 경찰청이 집중 단속을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정책 분야의 용어를 쓰면, 정책 의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곧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범죄화 모형(신고, 단속, 처벌)으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여성 폭력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면 갈 길이 정말 멀다. 여성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넘어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이다. 폭력의 범위까지(!) 제대로 규정하면(예를 들어 언어폭력), 실상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정기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지만, 모두가 빙산의 일각이라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는 그 방향만큼은 명확한 편이다. 잘 드러나지 않고 ‘개입’도 쉽지 않지만, 실천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아예 무관심하지는 않으니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야 할까.
문제는 예방이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얽혀 있고, 그중에는 구조와 환경이라 해야 할 고질적 문제와 도전이 여럿 들어 있다. 원인을 찾기 어렵지만, 해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나마 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 정부와 많은 지자체, 민간단체가 힘을 기울이는 교육과 캠페인이 그렇다. 열심히 잘하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효과가 ‘증명’된 것이 아주 적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가 성폭력과 파트너 폭력 예방 방법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보자.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사, 분석한 것을 종합해 일관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방법은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p.40, 본문 바로가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을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Promoting gender equality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바로가기).
– 양성평등 촉진(이것이 핵심)
–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
–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성을 참여시키는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
– 미디어를 통한 인식 변화
– 여성과 남성을 모두 참여시킬 것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라는 데에 동의한다. 여성 폭력 예방에 관심이 있는 공공과 민간 조직은 마땅히 효과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둘 것.
효과 있는 방법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고민이 줄지 않는다. 앞의 목록에서 핵심이라고 지적한 양성평등 촉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좀 더 깊고 오래된 문제, 그 근본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례를 통해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착취적인 남녀관계, 계급관계, 국제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마리아 미즈 지음,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펴냄. 360쪽)
한국의 여성 폭력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 경제 수준에 비해, 그리고 비슷한 여건을 갖춘 나라보다 더 심각한 양성 불평등이 여성 폭력과 파트너 폭력의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주 화요일(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 여성 폭력의 구조, 불평등의 구조가 더 걸리는지도 모르겠다. 때를 맞추는 통계와 보도자료, 행사도 좋지만, 새롭게 희망하는 데에 진정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역사와 그 결과물인 지금의 구조를 다르게 상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조의 결과이자 대표라는 점에서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주장하는 근거가 충분치는 않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껍데기만 여성 할당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여성 ‘권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것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제 방향이다.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지만, 제도가 새로운 관계를 촉발하는 계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독일은 올해부터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는 그 전부터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바로가기). 국제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의 여성 불평등이 꼴찌 수준인 것을 어찌 우연이라 할까(세계경제포럼의 양성평등지수에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 또는 그 무엇이라도, 구조는 나(우리)와 만나면서 새롭게 규정되고 변형된다. 여성 폭력에 깊게 개입하는 구조가 우리 모두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자 환경이라면, 나(우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여성 폭력의 구조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구조와 제도를 주장하고 밀고 가야 한다.